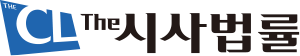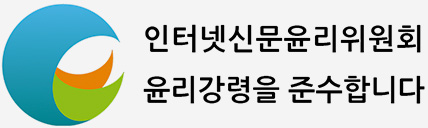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인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건설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10억 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공사대금 9억 605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씨에게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B씨가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고 수차례 A사에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할 경우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로 58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을 근거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B씨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또한 A사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