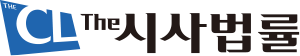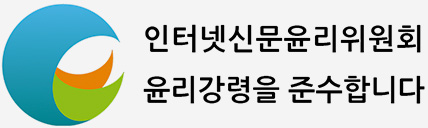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위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 한 현직 교도관은 <더시사법률>에 “요즘은 인권위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부 수용’으로 정리할지만 고민한다”며 “실제 관행이 바뀌기보다는 문서상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권고 체계는 유사 진정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안이 해마다 접수되지만, 개선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하거나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그 사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진정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회의감도 확산되고 있다.
수용자와 출소자들 사이에서도 진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최근 출소한 A씨는 “진정을 넣으면 오히려 문제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추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를까 봐 대부분 포기한다”고 전했다.
불투명한 교정행정 구조는 가석방 제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가석방 기준 공개와 과밀 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징벌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형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 외 대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재량준칙에 불과해 법령 규정은 부적절하고 공개 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권고가 반복적으로 공회전하면서 과거 교정 비리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K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전직 판사 출신 김모 변호사의 ‘교정 비리 브로커’ 사건은 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독방 배치나 가석방 편의를 약속한 사례다. 이 사건은 가석방 제도 운영이 인권위 권고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전 법무부 송무심의관 정재민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도 없다 보니 교정현장에서는 인권위 결정을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고 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인권위 등에 인권 침해를 신고한 수용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사실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들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인권위 권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 제도를 비롯한 여러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