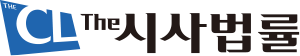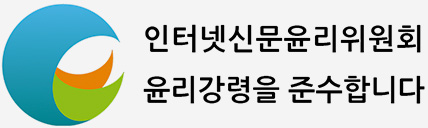최근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 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 완성 시까지 보존된다.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되며,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기관장 허가로 폐기될 수 있다.
재심 절차가 통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구조는 제도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평가다.
일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있다. 대검 예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죄질이 극악하거나 범죄 수법이 특이·지능화된 사건 등은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아닌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결국 재심 준비 사실을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기록은 그대로 폐기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재심 사건 상당수는 기록 부재라는 벽에 가로막혀 왔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사건 기록이 이미 폐기된 상태였고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역시 검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외부 자료가 재심의 단서가 됐다.
사형 확정 사건의 경우 형의 시효가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뒤늦게 진상 규명에 나서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검찰은 형사 기록 폐기 규모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최근 10년간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형사사건 기록의 연도별 총 건수에 대해 “전국 검찰청 차원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과거 기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기록 보존 문제를 단순한 행정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신뢰와 인권 회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심은 과거 판결을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지만, 그 출발선에 있어야 할 기록이 ‘시효’라는 관리 논리 속에서 소멸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제도는 근본적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차이가 적지 않다. 일본은 사형·무기징역 사건 기록을 50년간 보존하고 재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관리하며, 미국 역시 장기 보존 또는 영구 보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기록이 오래 남아 있어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종결 사건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며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권력 행사를 더욱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존기간 연장과 소급 적용, 전자기록 전환 등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