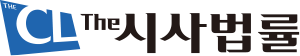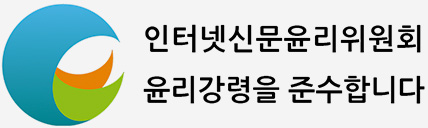환한 대낮,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서 홀로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훌쩍거렸다.
“왜 나는 매번 떨어지는 걸까? 이대로 취업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걸까?”
온갖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쓴 채 방바닥 한가운데 누워 애벌레처럼 몸을 웅크렸다.
벌컥— 엄마는 늘 그렇듯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 왜 또!”라며 이불 안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내 귀만 아팠다. 어둠을 뚫고 방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엄마는 이불을 확 걷었다.
“일 나라!”
방문 너머 비치는 거실 전등 불빛에 눈살을 찌푸렸다. 거실로 나가자 검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고, 싱크대에 물을 받아 상추와 깻잎을 담그며 말했다.
“삼겹살 3만 원어치 사 왔다! 먹자!”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나는 잔뜩 신난 듯한 엄마가 아니꼽게 보였다. 명치가 아플 정도로 속에 꽉 찬 이 답답함을 불효막심하게도 엄마에게 풀 심산이었다.
그때,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았다.
엄마가 갑자기 허공에 뒷발차기를 하는 게 아닌가…
육중한 몸매의 엄마가 짧은 다리를 뒤로 뻗어 두어 번 휙휙 차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황당해하는 나를 향해 다가온 엄마는 중국 드라마 속 무림고수처럼 “얍! 얍!” 소리를 내며 손날로 내 팔뚝을 때렸다.
“아야~ 아프다!”
“너 계속 패잔병처럼 방구석에만 있을래?”
“패잔병이라니… 아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내가 발끈하자 엄마는 호탕하게,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튀어나온 배를 탕탕 쳤다.
“먹어야 힘이 나지! 축 쳐져 있으면 니만 손해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본인은 보풀이 다 일어나도록 같은 옷만 입어도, 당신 아들이 기죽어 보이면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먹고 웃어야 한다며 나를 밖으로 이끌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 고된 직장생활 후에도 시장에 들러 먹을 것을 사 왔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다.
이런 내 속도 모르고 엄마는 나를 향해 씩 웃어보였다.
못난 아들을 무조건 믿어 줄 심산인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술을 힘껏 깨물었지만, 결국엔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엄마는 “실컷 울어라!”라고 한 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은 쏙 들어가고 웃음이 났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콧속을 뚫고 위장까지 침입했다. 집 나간 식욕이 돌아와 밥 달라고 항의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군 건 나 하나 뿐…집도, 엄마도 그대로였으니까…더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다짐하며 엄마의 밥상 앞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
그날 엄마가 해준 말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엄마는 항상 니 뒤에 있다. 언제든 지치면 뒤돌아봐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