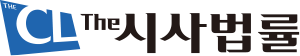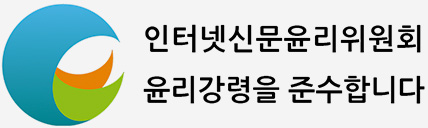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 실제 법원은 5년만 선고한다는 식의 통념이 여전히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검찰의 구형과 실제 형량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바로 구형이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든, 더 높게 선고하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이미 구형 전에 구체적 양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고보다는 비교 대상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형을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고를 결정한다”며 “양형을 이미 정해두고 결심공판을 맞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형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구형은 가장 처음 접하는 ‘숫자’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특히 형사 피고인에게 구형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
변호인 역시 구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구형과 선고 간 차이가 곧 ‘변호 성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이나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 변호인은 ‘실력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선고가 구형과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면 변호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인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검사의 구형이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2012년 대검찰청이 성범죄 사건 2,73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형량이 1개월 증가할 때 선고 형량은 평균 0.25~0.78개월 증가했다.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올려치기’)는 4.8%에 불과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박효과(Anchoring effect)’와 유사하다.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구형 수치가 판사의 판단에도 무의식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당시 보고서에서 “형량이 높아질수록 판단 착오로 인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구형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판사가 당초 징역 2년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면 심리적 기준점이 흔들리면서 4년 전후의 형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더시사법률>이 검사 구형량이 명시된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선고 형량과 구형이 일치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구형의 절반 이하로 선고된 사례는 10건이었으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올려치기’ 사례는 2건이었다.
이 중 한 사건은 검사 구형은 1년이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도 불출석한 정황이 반영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이 고려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은 나아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도구로도 기능한다.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공공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재심 사건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판단 변화가 드러난다.
검찰은 법원이 구형을 기준 삼아 자동 감경하는 현실을 의식해 일부러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적정구형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실무 반영은 미비한 상태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최성완 변호사는 “구형을 낮추면 그만큼 선고도 함께 내려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싶다면 실제로는 3~4년을 구형해야 한다”며 “정확히 예측해서 구형하면 형이 과도하게 깎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는 “구형은 선고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지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검찰은 구형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법원은 양형기준과 판례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