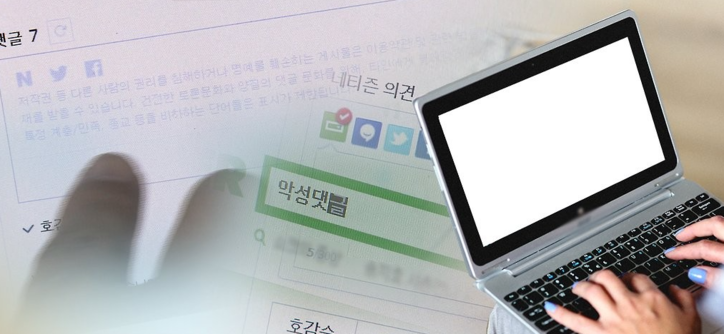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공연히’라는 요건이다. 즉,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이 공개됐는지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도둑놈들이 보는 신문” 표현…특정성 충족
특히 “도둑놈들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직업과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특정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과 맥락을 통해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이라는 표현은 특정 집단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법조계는 이 같은 발언이 일반적 비유나 풍자를 넘어 수형자 집단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로 쓰였다면, 수형자 개인 또는 단체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특정 집단을 지칭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사회통념상 식별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1235)"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 아닌 조롱이나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했다면,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표현의 내용·성질·공표 상대방의 범위·방법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익명이라도 추적 가능…합의 여부가 관건
결국 이 사건의 댓글은 특정성을 갖추고 비방 목적도 드러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당사자가 고소를 결정한다면 익명이라도 작성자 특정이 가능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민의 박대희 변호사는 “익명이라도 서버 로그와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삭제했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상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익명’이거나 ‘삭제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