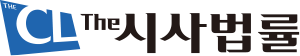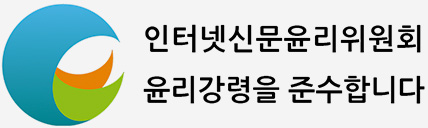법조인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 필자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판사로 있을 때가 사람이 더 단단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보인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나는 그 ‘정리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사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더 자주 느낀다.
판사로 있었을 때는 기록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보니 그 기록에 닿기 전 의뢰인의 시간과 그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먼저 보게 된다. 법정 안에서는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변호사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 쓰인 문장은 단정하지만 그 몇 줄의 기록에 불과한 사정 뒤에는 한 사람의 가족, 삶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 판사의 일은 냉정하다. 결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책상 위에 쌓이고 각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검사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속에서 판사는 오직 ‘공정함’만으로 대답해야 한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판결문에 적히는 것은 오직 사실, 증거, 법리뿐이다.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의 목소리보다 법조항의 문장이 더 익숙해진다. 판사는 결국 사람을 보되 ‘사람의 사정’을 보지 못하는 자리다. 그리하여 언젠가부터 법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흐릿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문장으로만 들리기 시작한다.
판결은 정확해졌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판정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두려움, 억울함, 후회, 절망. 그 감정들이 법정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끈을 잡고 서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의 판결문이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때 내렸던 ‘합리적인 결론’ 속에도 이런 얼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표정들,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아주 선명하게 들려온다. 변호사는 판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변호의 본질은 논리보다 ‘공감’에 가깝다.
때로는 법리가 아니라 한 줄의 진심이 증거보다 더 강력하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대신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보는 자리다. 하지만 변호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본다. 둘 다 모두 법을 다루는 자리지만 하나는 사람을 단정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설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판사로 있을 때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이 더 어렵다. 법은 항상 같지만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 속에는 수많은 사정이 얽혀 있다. 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호하고 비논리적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한 마디, 하나의 표정,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다.
과거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은 그 단 하나의 표정을 이해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한다. 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이다.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여전히 법조인이라는 길 위에 서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사람의 편’에 서게 되었다.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면, 변호사는 그 정의가 인간의 삶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자리다.
판사는 결론을 남기고 떠나지만 변호사는 사람을 남기고 떠난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법정 안팎에서 달라진 시선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시선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