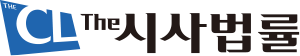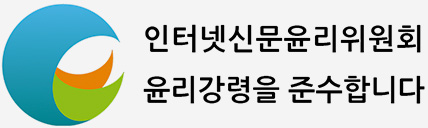본인 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땅 위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의 묘와 C씨 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족 측이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다시 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평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 존재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묘 이장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평온과 인륜적 감정으로 이해된다. 판례 역시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발굴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나아가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태우거나 분쇄·폐기하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161조 제2항의 ‘분묘발굴 후 유골손괴’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정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장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연고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공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고자 존재 여부, 통지의 실질, 권리관계 분쟁에 대한 인식, 발굴 방식의 상당성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내 땅이니 내가 처리한다는 자력구제식 접근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묘가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개장 절차와 연고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형사적 위험을 피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